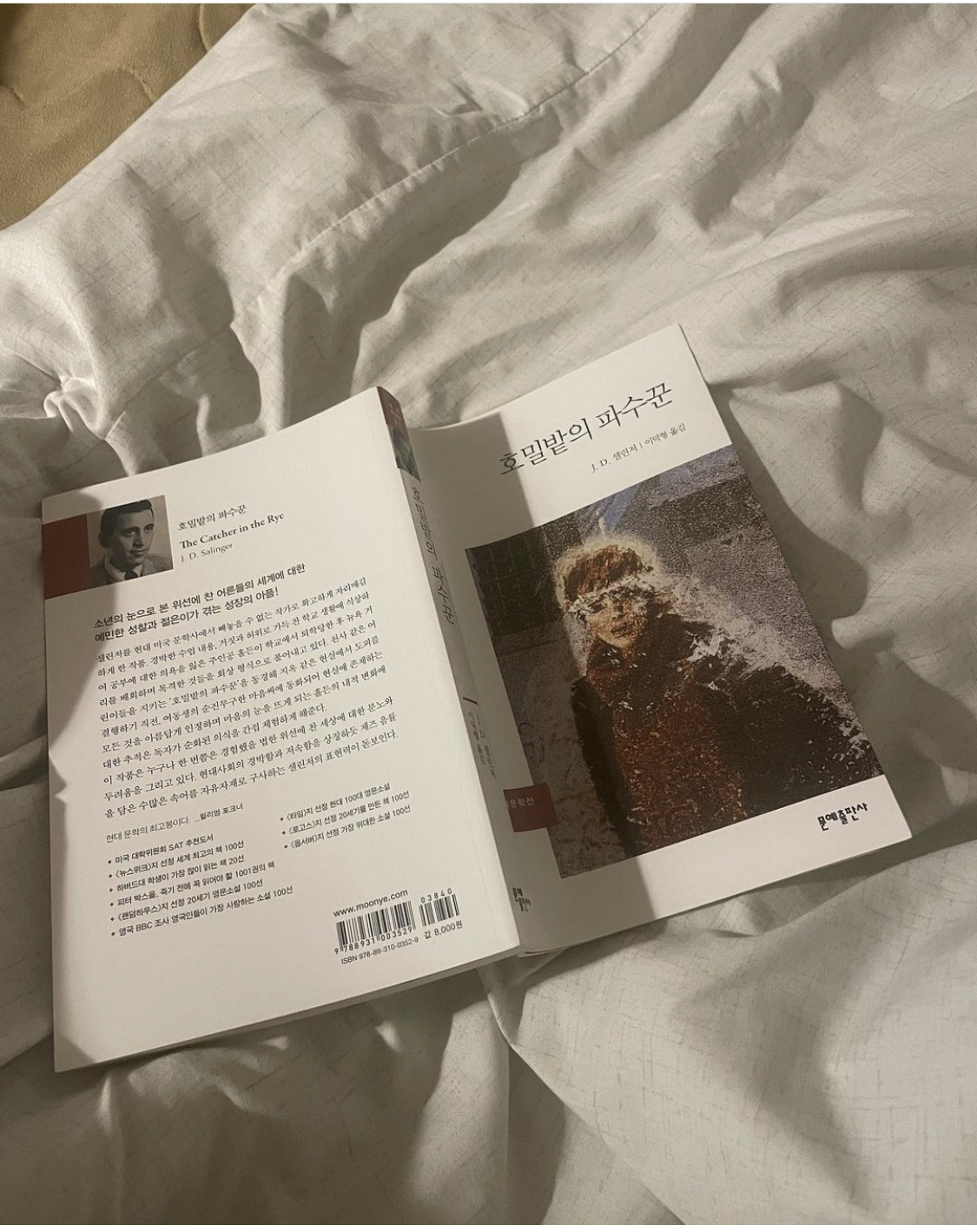
<호밀밭의 파수꾼>, J.D 샐린저/이덕형 옮김, 문예 출판사(1985)
하여튼 12월이었다. 날씨는 마녀의 젖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._p11
국도를 횡단하자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. 정말 미치광이 같은 오후였다. 무섭게 추운 데다 햇빛조차 보이지 않았다. 그래서 길을 건널 때마다 흡사 사라져 가는 기분이었다._p13
그가 그렇게 요란하게 끄덕이고 있는 것이 열심히 사색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엉덩이와 팔꿈치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늙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._p17
그는 악수할 때 상대편의 손가락을 마흔 개 정도 부러뜨리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을 그런 유형이었다._p133
앤톨리니 선생은 다시 담배에 불을 당겼다. 악마처럼 담배를 피웠다._p275
그런데 비가 미친놈처럼 오기 시작했다. 물통을 들이붓듯 억수로 내렸다._p309
백 년 전쯤 읽었던 호밀밭을 다시 읽었다. 다시 읽었다고 하기엔 처음 읽는 기분이라 멋쩍다. 일단 재밌다. 책을 읽으면서 키득거리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 내 경우엔 '홀든'이 웃기다. 앤톨리니 선생님과 나눈 대화라거나, 죽은 동생 앨리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나, 막냇동생 피비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다뤄 이야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. 지금 나는 따분한 책 소개를 늘여 쓰려는 것이 아니다. 이건 정말이다.(홀든을 좀 따라 해 봤다.)
고등학교 때가 생각난다. 잊고 있었던 기억. 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길 내게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. 내가 뭔가 힘들다고 털어놓은 건지, 사고를 쳤던 건지 어쨌든 담임 선생님과 나는 단둘이 앉아 있었다. 아마 후자였던 것 같다.
내가 뭔가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, 항상 그랬던 학생은 아니었기에 선생님이 불렀다. 교무실은 아녔다.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.
이야기는 이렇다. 선생님이 직장과 미래에 대해 불안하던 어느 밤, 가까운 바다를 알아보고 차를 끌고 나갔다. 몇 시간이고 운전해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. 헤매다 어떤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멈췄다. 해가 뜨고 있었다. 다리 밑이, 헤매던 자리들이 모두 바다였다.
왜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냐면, 선생님은 지방에서 도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은커녕 스마트폰은 아주 먼 미래에 등장하는 시절이기 때문이다. 조선시대까지는 아니다, 자동차는 있었으니까. 하여튼 선생님 말의 요지는 ‘등잔 밑이 어둡다.’는 아녔다. 덧붙여 느끼하지 않게 뭐라 더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.
난 이 선생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긴 좋았다. 벌써 다들 알았겠지만 선생님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니까. 그 드라마 ‘응답하라, 1988’맞나? 거기서도 이런 대사가 있지 않나. “미안혀,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여.”
이 선생님에 대한 다른 좋은 기억도 있다. 또래의 다른 선생님이 있었는데 꼭 그 다른 선생님이 뭐라 놀리고 도망가고 서로 쫓고 그랬다, 중학생들처럼. "니 잡히면 진짜 죽는데이."이렇게 말하면서.
좀 횡설수설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. 앤톨리니 선생님은 홀든에게 아주 좋은 말들을 해준다. 가장 필요한 말들이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홀든의 마음을 바꾼 건 어린 여동생 피비다.
제아무리 훌륭한 글이나 이야기도, 엄마의 맞춤법 틀린 몇 마디 편지나 카톡만큼 마음의 멱살을 뒤흔들거나 포풍눙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건 없다는 거다. 이건 정말이다.
샐린저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통해 표현한 것은 사춘기가 아니었을까 싶다. 성장소설이니 당연한 말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. 어제오늘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의 일부다. '아니, 이렇게 길이 좁은데. 난 몸을 이만큼이나 옆으로 틀었는데, 이 사람은 똑바로 걸어오네? 매너 존나 없네.’ '카페에 사람이 이렇게 많는데 저렇게 목소릴 크게 내고 욕을 한다고? 애들도 아니고 대체 뭔 일하는 사람들이야?’ '스터디 카페 알바 면접이라 속이고 성폭행을 했다고? 문 앞에 남자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고?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.’
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물음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다. ‘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데?’
십 대 때든 이십 대 때든 지금이든 대답은 언제나 같다. ‘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. 내가 좋아하는 일로, 잘하는 일로, 아니 그런 거 없더라도.’ 십 대가 지나도 사춘기는 끝나지 않는다. 세상은 미쳤고 나는 쓸모없다. 호밀밭의 파수꾼은 그래서 읽히고 가치 있는 게 아닐까.
'산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<구정 이야기> (4) | 2023.09.25 |
|---|---|
| 아버지의 ‘무빙’ (2) | 2023.09.12 |
| 등목 (5) | 2023.09.01 |
|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고.. (2) | 2023.08.29 |
| 새삼 지식의 중요성 (1) | 2023.06.09 |



